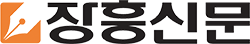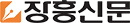고향, 내 몸이 기억하는 첫 집
지난날을 돌아보면 마음이 저릿하다. 장흥에서 태어나 자랐고, 장흥의 초중고를 거쳐 교직에 들어서서는 장흥고와 장흥여고, 관산고에서 근무했다. 교가를 작사했던 시절을 떠올리면, 세월이 흘러 돌아가는 기찻길처럼 아득하기만 하다.
장흥은 나에게 ‘돌아가고 싶은 첫 고향’이다. 용산면 계산리는 내 육신의 고향이다. 어린 시절, 계산리의 하늘과 땅은 세상의 전부였다. 마당에서 흙을 만지고, 개울가에서 아버지와 동생과 함께 투망으로 피리와 은어, 미꾸라지를 잡으며 흘려보내던 하루가 세상의 일상이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고향이 베풀어준 따뜻한 선물이었다. 겨울밤 아궁이의 불빛, 지친 어깨를 토닥이던 계산리의 바람, 봄마다 새순을 틔워주던 들녘의 향기. 이 모든 것이 내가 고향에 진 빚이었다. 내 육신은 계산리의 흙과 바람 속에서 만들어졌다.
마음의 고향, 삶의 중심을 붙드는 뿌리
고향 집 마당에 들어서면 발바닥의 감촉이 먼저 옛날을 기억해낸다. 마당 꽃밭의 흙냄새, 낙엽 사이의 습기, 맨발로 뛰놀던 어린 날의 자유가 되살아난다. 육신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본향, 내 몸이 기억하는 고향이다.
내 고향 용산면은 사계절마다 얼굴을 달리한다. 봄이면 진달래와 감나무 꽃이 피고, 여름이면 짙은 녹음이 산을 덮는다. 가을에는 황금빛 들녘이 펼쳐지고, 겨울에는 된장국 냄새가 집집마다 따뜻하게 번진다. 어머니의 손맛이 밴 그 냄새 속에서 나는 흙먼지를 먹으며 자랐다. 삶이란 결국 마음의 고향을 잃지 않는 일이다. 내 마음의 고향은 어린 시절 나를 품어주던 할머니의 품이었고, 오래된 친구와의 웃음소리였다.
때때로 내가 누구였는지도 잊고 지낸 자리에 서면,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 “괜찮아, 잠시 쉬어가도 돼.” 그 말에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걸음을 내딛는다. 누군가에게 마음의 고향은 오래된 일기장일 수 있고, 또 다른 이에게는 마루 끝에서 들리던 어머니의 발소리일 수도 있다. 그것은 삶의 중심을 잃지 않게 붙잡아주는 뿌리 같은 존재다. 나에게 그 뿌리는 용산면이다. 그곳이 있기에 나는 다시 용기를 내어 살아간다.
장흥은 내 정치적 고향
고향이란 단어는 묘한 따뜻함이 있다. 고향은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낡은 골목, 서늘한 저녁 바람, 익숙한 말투와 사람들의 부드러운 눈빛이 떠오른다. 그런데 삭막한 정치에도 고향이 있을 수 있을까. 정치에도 그리움과 정체성이 깃들 수 있을까. 그러나 누가 뭐래도 장흥은 내 정치적 고향이다. 전국적으로 연속 다섯 번이나 교육위원에 선출된 경우는 나 말고 전국 그 어디에도 없다. 나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었던 장흥이 있었기에 별 능력도 없으면서 전국 유일의 5선 교육위원이 될 수가 있었다. 전남 교육감 선거에 두 번이나 나가 비록 차점, 3표 차로 낙선되었지만 장흥은 내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었다.
적어도 내게 장흥은 그리움과 정체성이 깃든 정치적 고향이다. 나는 장흥의 보통 사람들처럼 정의를 원하고 공정을 갈망했으며 모두가 조금 덜 불행한 세상을 바랬다. 장흥 사람들과 나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모순된 감정이 휘몰아쳤지만 나는 그곳에서 나다운 생각을 키워왔다. 태도이자 사유이며 희망인 정치적 고향이 내게는 장흥이란 지역사회였던 것이다. 나는 오늘도 그 고향 속에 살며 동시에 오늘도 그 고향을 새로 짓는다.
“문화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남에게도 행복을 준다.”
내가 살아온 삶 어느 한구석이라도 장흥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 나는 평생을 장흥에 빚지며 살아왔다. 장흥은 내게 더할 나위 없는 정을 퍼주었는데 나는 장흥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항시 생각한다. 모든 것이 빚졌다는 말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동안 내가 장흥을 위해 해 온 것이 있다면 장흥에 빚진 내 삶에 대한 빚 갚음에 불과하다. 지금 맡고 있는 장흥문화원장 역시 장흥에 빚을 지고 당선된 것이기에 어찌 갚아야 할지, 어떻게 하면 장흥문화원을 신축하고 발전시킬지 늘 생각하며 산다. 나의 어제는 모두가 장흥의 은혜였고, 나의 오늘은 장흥의 덕분이다. 만일 나에게 기다려지는 내일이 있다면 그 또한 장흥의 배려일 것이다. 내 어찌 장흥의 보살핌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장흥에 빚진 내 맘을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토요일 국사봉에서 출발해 천관산을 오르는 산행을 했다. 문화원장 취임 시 ‘국사봉에서 천관산까지 문화의 꽃이 만개하는 문화강군(文化强郡) 장흥을 만들어보겠다.’라는 약속을 돌아보기 위해서다. 산길에서 마주한 나의 작은 진실들이 잠깐의 숨소리조차 자연의 민폐처럼 느껴지는 고요함 속에 있었다. 산의 품에 안겼다. 바람은 오래된 이야기를 건네려는 듯 귓가를 맴돌았다. 천관산 발아래 다도해의 섬들이 마치 수묵화처럼 펼쳐지고 바람은 저 멀리 남해의 짠 냄새를 실어 날랐다. 그것은 다시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다. 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를 가장 깊이 위로했다. 마음이 흐려질 때면 국사봉의 침묵을 떠올릴 것이고 천관산의 바람을 기억할 것이다. 육신의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 그리고 정치적 고향인 장흥에 빚진 삶, 바람과 침묵으로 갚아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