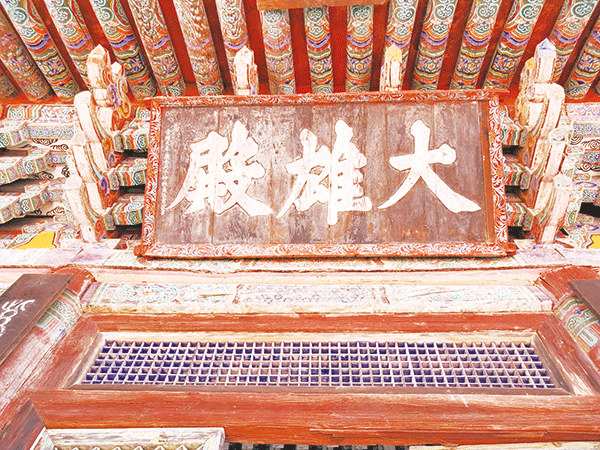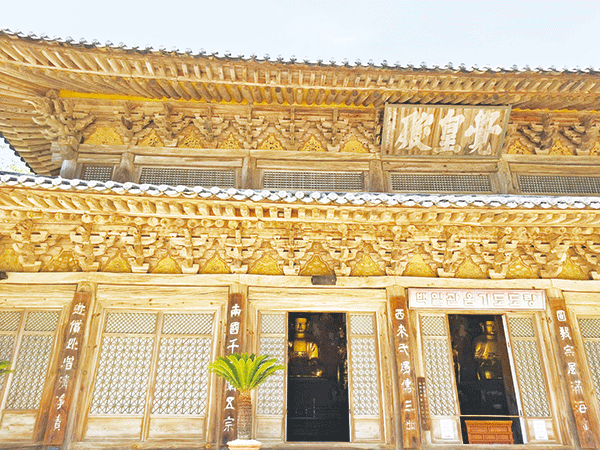聞夫佛以大圓覺爲伽藍 寧假宮室之崇也 身則混虗空爲體性 詎雕栴檀之像乎 然而惑業自覉縻 苦海長淪而莫出 無明所暗蔽 昏衢永夜而不晨 肆以匪相好百福之莊嚴 那可得而瞻仰
微締構三休之壯麗 無以示其重威 斯可止哉 不得已也 智異山大華嚴寺者 鰈域千年之裨補 鳳城一縣之襟喉 却倚般若之雄峰 上出玄霄而無極 前臨鴨綠之巨壑 東注滄溟而不休 翠栱朱甍 起虹霓於層閣 金輪玉鏡 環日月於廻廊 地仙獻藥笛聲 聞雲中之雞犬 林禽含異菓香 飄鳥外之樓臺 千竿綠竹猗猗 似入蔣生之徑 一帶靑溪決決 如聞伯牙之絃 天女散華 落曼陀於金地 龍王噴水 飛玉溜於珠盤 紫栢爐香 傃金山而吐霧 靑松談 昇法座而梳風 關朔眞僧 爭投解虎之錫杖 嶺湖開士 竸擲藏虬之鉢盂 否泰相乘 興廢有數 奄遭島夷兵烽之慘怳 如栢梁煨燼之餘 祗園興版蕩之悲 㝎水穴鯨鯢之浦 區宇積淪胥之痛 慈門伏狐狸之場 釦礎徒存 非復鶯林之樹 苾蒭焉托 空傳鷲嶺之基 白馬悲嘶 蒼牛吼去 岩枝泣露 磵戶摧梁 爰有碧巖大長老 道亞生融 德侔安遠 爲四衆倡 潜圖彼岸之功 結萬人緣 即揆爲山之業 於是披榛薙草 與月殿之全模 累土開林 起珠臺於始簣 毳衲得以安棲 梵鐘以之交響 惟丈六之寶殿 與金而共灰 兼十萬之偈言 並玉石而俱碎 有耳目君子 莫不興嗟矧居停主人 寧無泚顙 玆有鶴駕道人性能 仙露明珠之朗潤 松風水月之襟胸 汲引四生 津梁三界 如優曇一現 欲創大事之因緣 令佛日再中 要作四軰之歸嚮 度木於山也 取徂松甫栢之良材 擇工於衆焉 召王爾班輸之妙手 萃之以日力 鳩之以歲功 即舊以謀新 其規益壯 塑像而覆閣 其直良多 任重道遠 微蚊負山而難堪 事鉅力綿 寃禽塡海而無路 一毛不拔 雖或有獨善之心 百足不僵 庶可仗相扶之力 玆非小報 未可殫言 擧欣欣然 與之釜與之庾 與之粟九百 是區區者 俾爾昌 俾爾熾 俾爾壽萬千
출전 [栢庵集]下
注)
大圓覺 - <원각경(圓覺經)>에서 유래한 말로 광대하고 원만한 지각(知覺)이라는 뜻으로 부처의 지혜를 뜻한다.
三休 - 세 가지 쉬어야 할 이유라는 뜻으로 당나라 때 시인 사공도(司空圖)가 만년에 벼슬에서 물러나 중조산(中條山) 왕관곡(王官谷)에 삼휴정(三休亭) 또는 휴휴정(休休亭)이라는 정자를 짓고 그 기문(記文)인 〈휴휴정기(休休亭記)〉에 “첫째는 재주를 헤아려 보니 쉬는 게 마땅하고, 둘째는 분수를 헤아려 보니 쉬는 게 마땅하고, 셋째는 귀 먹고 노망했으니 쉬는 게 마땅하다.<蓋量其才一宜休 揣其分二宜休 耄且聵三宜休>”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地仙 - 명산(名山)에서 유유자적하게 노니는 사람을 일컫는 말.
蔣生之徑 - 한(漢)나라 때의 고사(高士)로 《문선(文選)》 권30 〈밭 남쪽에 동산을 만들어 물을 끌어들이고 나무 심어 울타리를 세우다[田南樹園激流植援]〉에 “오직 장생(蔣生)의 오솔길 열어 길이 양중과 구중 따르리라.[唯開蔣生徑, 永懷求羊蹤.]” 하였는데 이선(李善)의 주(注)에 “장후(蔣詡)가 두릉(杜陵)에서 은거하면서 세 갈래 오솔길을 내놓고 오직 양중과 구중과 종유하였다.”고 하였다.
談麈 - 불주(拂麈)는 곧 고라니의 꼬리털로 만든 먼지떨이를 가리키는데 옛사람들이 이것을 손에 들고 청담을 나누었던 데서 온 말이다.
栢梁 - 栢梁臺. 한 무제 때 불에 탔다.
仙露 - 한 무제(漢武帝)는 구리쇠로 선인장(仙人掌)을 높게 만들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받았다.
釜(부) - 용량의 단위. 엿 말 너 되(六斗四升).
庾(유) - 용량의 단위. 16두(斗)란 설도 있고 2斗 4升이란 설도 있다.
◆구례 화엄사 장륙전과 불상을 중건 조성하는 권선문
듣자니 저 부처님은 대원각(大圓覺)을 가람(伽藍)으로 삼았는데 어떻게 높다란 궁실(宮室)을 빌리겠는가.
몸은 커다란 허공을 체성(體性)으로 삼았는데 어떻게 전단나무에 불상을 새기겠는가.
그렇지만 번뇌와 업(惑業)에 절로 회유(懷柔, 覉縻기미)되어 고통의 바다에 깊이 빠져 탈출하지도 못하고 무지의 상태에서 번뇌가 마음을 가려 사물의 이치를 모르니 어두운 거리에 밤이 계속되고 새벽이 찾아오지도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가지 복을 갖춘 장엄한 상호가 아니라면 어떻게 우러러 볼 수 있겠는가.
삼휴(三休)의 웅장하고 화려(壯麗)함을 얽어매지 않으면서 그 무게와 위엄(重威)을 보여줄 수 없으니 이를 그만둘 수 있겠는가. 그칠 수는 없는 일이다.
지리산 대화엄사(智異山大華嚴寺)는 우리나라(鰈域)의 천년 비보사찰로서 봉성(鳳城, 구례군) 일개 현(一縣)의 요충지(襟喉)이다.
되레 반야의 웅장한 봉우리에 의지하여 위로는 높은 하늘에 솟아올라 끝이 없고 앞으로는 압록의 큰 골짜기에 임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넓고 큰 바다에 물을 흘러내리면서 쉬지를 않는다.
비취색 두공과 붉은 용마루(翠栱朱甍)가 층층 누각에 무지개처럼 일어서고 황금바퀴와 옥빛거울(金輪玉鏡)은 회랑을 해와 달처럼 둘렀다.
지선(地仙)이 약을 지으며(獻藥) 부는 젓대 소리와 닭 개 소리가 구름 속에서 들리고 수풀 새는 기이한 과일 향을 머금고 새는 누대 밖을 떠돈다.
수많은 장대의 푸른 대나무는 아름답고 무성해서 장생의 오솔길(蔣生之徑)로 들어가는 것 같고 청계수 한줄기는 콸콸 소리를 내니 백아의 거문고 소리를 듣는 것 같다.
여자 선인(天女)이 꽃을 뿌리는 것처럼 만다라화가 절간에 떨어지고 용왕이 물을 뿜는 것처럼 붉은 소반(珠盤)에는 옥 같은 물방울이 흩날린다.
자줏빛 잣나무 향로는 금산(金山, 佛身)을 향하여 안개를 토해내고 푸른 소나무가 청담할 땐 불주로 먼지를 털어내면서(淸談塵拂麈) 법좌를 타고 바람을 빗질한다.
변방 북쪽의 참된 승려(眞僧)가 석장을 휘둘러 범 싸움을 말리고 영호남의 보살들이 규룡을 감춘 발우를 다투어 던졌다.
비괘(否卦)와 태괘(泰卦)가 반복되니 흥함과 폐함에도 운수가 있어서 구례 대화엄사는 갑작스런 섬나라 오랑캐(島夷)의 참황(慘怳)한 전쟁 불기운을 만나 한(漢)나라 백량대(栢梁臺)의 타고남은 잔해더미 같았다.
기원정사에는 어지러운 슬픔(版蕩之悲)이 일어났고 정수굴(㝎水穴)은 경예(鯨鯢, 고래의 수컷과 암컷. 왜적)들의 포구(浦口)가 되었으며 각 구역에는 몰락의 아픔이 쌓여갔고 자비의 문(慈門)은 여우와 살쾡이(狐狸, 소인배)가 엎드린 도량이 되었다.
한갓되이 구슬을 박아 꾸민 주춧돌만이 남아 있고 다시는 꾀꼬리가 찾는 숲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비구(苾蒭)들이 의탁하겠는가.
부질없이 영취산의 터전만을 전하고 있으니 백마(白馬)가 슬프게 울고 푸른 소(蒼牛)가 울부짖으며 떠나가고 바위가의 나뭇가지(岩枝)는 이슬에 젖고 개울어귀(磵戶)는 다리가 무너졌다.
이에 벽암 대 장로(碧巖大長老)가 계셨으니 도(道)는 생융(生融, 魏晉시대 구마라즙 문하의 도생道生과 도융道融 두 哲人)에 버금가고 덕(德)은 안원(安遠, 晉代의 고승 도안道安과 혜원慧遠)을 본받아 사부대중을 창도(唱導)하다 틈을 보아 피안의 공업(彼岸之功)을 도모하면서 만인과 인연을 맺어 바로 아홉 길의 산을 만드는 사업(爲山九仞之業)을 헤아려 보았다.
그리하여 가시덤불을 헤치며 풀을 베어내고 월전(月殿, 寺院)의 온전한 모양을 따라 숲 사이에 흙을 쌓는 일부터 시작하더니 끝을 마치고 주대(珠臺)를 세웠다.
누더기를 걸친 중(毳衲 취납. 禪客)들이 편안히 묵을 곳을 찾자 범종이 서로 교대하며 울려댔다.
장륙보전도 금빛 불구(佛)와 함께 먼지가 되고 겸하여 십만의 게송이 옥석과 나란히 함께 부서지자 눈과 귀가 있는 군자로서 탄식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하물며 머물러 사는 주인이야말로 어찌 이마에 땀이 나지 않았겠는가.
이에 학가도인 성능(鶴駕道人性能)은 신선이 먹는 이슬(仙露)에 찬란한 구슬(明珠)처럼 밝고 윤기가 흘러 솔바람과 물속의 달과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는 자로서 사생(四生. 난생卵生ㆍ태생胎生ㆍ습생濕生ㆍ화생化生)을 계도하여 삼계(三界, 욕계欲界ㆍ색계色界ㆍ무색계無色界)의 나루터 다리(津梁)가 되니 우담바라가 한번 나타난 것과 같았다.
큰일을 시작하고자하는 인연은 불교를 다시 중천에 떠오르게 하고(佛日再中) 나라 안의 네 부류(四軰, 四部大衆)를 불교에 귀의(歸依)시키고자 해서였다.
조래산의 소나무(徂徠之松)와 신보산의 잣나무(新甫之柏) 같은 좋은 재목의 수량을 따지고 나서 대중들 가운데 공인을 고르고(擇工) 왕이(王爾)와 반수(班輸)의 명인(妙手)을 불러들였다.
세월이 흐르자 일 년의 공역(功役)이 모여서 옛것을 쓸어버리고 새것을 만드니(舍舊謀新) 그 규모가 더욱 장대하였다.
불상을 조각하고 전각을 덮자 그 가치는 진실로 커서 책임은 무겁고 갈 길은 멀어(任重道遠) 작은 모기가 산을 짊어진(微蚊負山) 것처럼 감당하기 어렵고 일은 많고 힘은 모자라서 새가 돌멩이를 물어다가 바다를 메우려는(寃禽塡海) 것처럼 길이 없었다.
터럭 하나 뽑지 않으면서 혹시라도 자기 한 몸만을 홀로 착해지려는 마음(獨善之心)이 있는가.
지네 같은 벌레도 죽음에 이르러서는 넘어지지 않는다(百足之蟲至死不僵,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 쉽게 망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서로 돕는 힘을 의지할 수만 있으면 괜찮았다.
이 역사(役事)가 조금이라도 알려진다면 다 말로 표현하지 않을 수는 없으리라.
모두가 흔연히 기뻐하는 기색으로 부(釜)를 주고 유(庾)를 주고 곡식 구백(粟九百)을 준다면 이같이 몹시도 부지런히 애쓰는 사람들(是區區者) 그대들은 창성(昌盛)하게 되고 그대들은 치성(熾盛)하게 되고 그대들은 천만년 수(壽)를 누리게 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