龍灣感興(용만감흥)[1]/학봉 김성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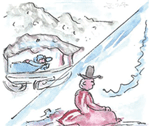
초저녁 변방에서 투숙을 하려는데
용만의 땅에서는 눈보라 사나운데
기자의 요동 변새는 아득해라 더욱 더.
薄暮投邊鎭 龍灣雪意驕
박모투변진 룡만설의교
箕封行已盡 遼塞望還遙
기봉항이진 료새망환요

장군이 변방을 지키는 심회는 남다르다. 김종서 장군이 북방을 지키면서 잠을 이루지 못한 심회를 읊었던 시상을 보나, 성웅 이순신 장군이 한산섬 수루에서 미동 소리를 듣었던 흔적 모두는 적진의 작은 소리도 가만히 넘기지 않았던 것은 분명했겠다. 병사들은 곤한 잠에 취해 있지만, 장군에서 조금도 방심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초저녁 변방의 진영에서 하룻밤 투숙하려 했더니만, 용만 땅에는 눈보라가 이토록 사납구나 라고 읊었던 시 한 수를 번안해 보았다.
요동 땅 변방 요새 바라보니 갈 길 더욱 아득해라(龍灣感興)로 번역해본 오언절구다. 작가는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1538∼1593)로 조선 중기의 문신, 학자이다. 할아버지는 김예범, 아버지는 김진, 어머니는 민세경의 따님이다. 동생은 김복일과 함께 어릴 때부터 빼어나 여느 아이와 달랐다고 한다. 9세 때에 정부인이 작고하였다는데, 성인처럼 애훼(哀毁)하였다고 한다. 위 한시 원문을 의역하면 [초저녁 변방의 진영에서 하룻밤 투숙하려 했더니만 / 용만 땅에는 눈보라가 이토록 사납구나 // 기자의 땅으로 더 이상 갈 길은 다했는데 / 요동땅 변방의 요새를 바라보니 갈 길 더욱 아득해라]라는 시심이다.
위 시제는 [용만 가는 길에 감흥이 일어[1]]로 번역된다. 용만(龍灣)은 ‘의주’의 옛이름이다. 저 건너엔 압록강이 길게 누워있어 북진하여 너른 벌판을 도모하자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지척엔 이성계가 회군을 했다고 하는 위화도가 버티고 있는 변경이다. 김종서가 육진을 개척하여 우리 땅으로 흡수한 곳도 지척에 있다.
시인도 임진왜란 때의 장군이었던 높은 기상을 담아내고 있다. 날이 저물어 초저녁 변방의 진영에서 투숙하려고 잠자리에 들었더니 용만 땅에는 눈보라가 매우 사납구나 라는 선경의 시상을 일으켰다.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수루에서 장검을 메만졌던 그 기상과 다를 바가 없다. 적을 무찔러야 한다는 일편단심 충정만이 가슴에 요동치고 있었을 것이다.
화자의 후정이란 심회는 적진으로 들어가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고야 말겠다는 충정을 일구어낸다.
기자의 땅으로 갈 길이 이제 다했는데, 요동땅 변방의 요새를 바라보니 갈 길 더욱 아득해라 라는 시상을 일으키고 있다. 요동을 기필코 정복하여 다시는 이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해야 겠다는 결의가 내면에 숨겨져 있음을 보인다.
위 감상적 평설에서 보였던 시상은, ‘변방 진영 투숙할까 용만 눈보라 사납구나, 기자 땅은 다했는데 변방 요새 아득해라’라는 시인의 상상력과 밝은 혜안을 통해서 요약문을 유추한다.
【한자와 어구】
薄暮: 초저녁. 직역하면 엷은 저녁임. 投: 투숙하다. 邊鎭: 변방의 진영. 龍灣: 용만. 지금의 의주땅임. 雪: 눈보라. 意驕: 매우 사납다. // 箕封: 기자조선의 개국했던 땅. 곧 중국 대륙을 뜻함. 行: 가다. 已盡: 이미 다하다. 遼塞: 요동의 변방. 望: 바라보다. 還遙: 돌아갈 길이 아득하다.
<문학평론가ㆍ시조시인/사)한교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