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판에 새겨진 ‘백제사마왕(百濟斯麻王)’이란 글자가 눈에 들어오자 발굴단은 흥분을 누를 수 없었다. “무령왕입니다!” ‘사마’는 백제 25대 임금 무령왕(재위 501~523)이었다.
1971년 7월 8일 충남 공주, 누가 묻힌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진 유일한 한국 고대 임금의 무덤이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냈다. 역사학과 고고학의 기념비적 사건이었던 백제 무령왕릉 발굴이 8일로 50주년을 맞았다. 그것은 한마디로 ‘실패를 딛고 일어선 이정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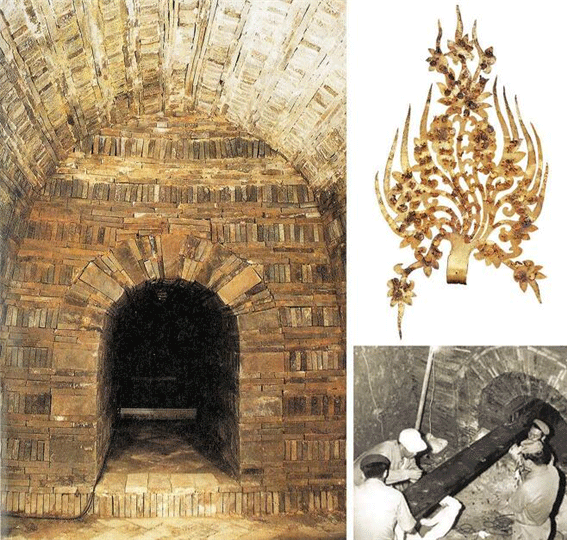
◇우연한 발견과 12시간의 ‘”졸속발굴”
무령왕릉 확인 3일 전, 공주 송산리 고분군 배수로 공사 도중 인부의 삽에 웬 벽돌 모서리가 걸렸다.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백제 전축분(벽돌 무덤)의 출현에 김원룡 국립박물관장을 비롯한 발굴단이 급파됐다. 발굴은 7일 오후 시작됐고 무덤 속에서 피장자가 누군지 기록한 지석(誌石)을 찾아냈다. 김원룡 관장이 취재진 앞에서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임을 밝히자 모두들 흥분했다. 공주의 백제 무덤은 그때까지는 모두 도굴됐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주변의 독촉에 발굴단의 마음이 급해졌고, 실측과 촬영을 대충 끝낸 뒤 4600여 점에 이르는 유물을 12시간 만에 서둘러 퍼담았다. 당시 학예사로 현장에 있었던 조유전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지금 같으면 최소 1년은 걸렸어야 할 발굴을 졸속으로 끝냈던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회고했다.
◇한국 고대사 비밀을 연 종합선물세트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령왕릉 발굴은 ‘고대사의 블랙박스를 열었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성과였다. 국보로 지정된 유물만 17점이었다. 금제 관모장식은 백제의 예술적 경지를 대변했다. 불꽃이 타오르는 듯 역동적인 왕의 장식과, 꽃병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듯 단아한 왕비의 장식이었다. 또 금귀걸이와 금목걸이, 신수(神獸·신령스러운 짐승) 무늬 거울, 베개, 무덤 입구에 뒀던 그로테스크한 진묘수(鎭墓獸·무덤을 지키는 짐승) 조각 등 ‘A급’ 유물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삼국사기’ 기록의 정확성이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무덤 지석에 쓰인 무령왕 별세 연도가 ‘삼국사기’와 일치했던 것이다. 백제가 활발한 대외 교류를 벌였던 실상도 드러났다. 무덤 양식과 부장품인 청자는 중국 양(梁)나라에서 온 것이었고, 목재는 일본산 나무를 갖다 썼다. 수많은 유리 구슬은 화학 성분 분석 결과 인도 남부나 태국산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왕과 왕비는 삼년상을 치렀다는 당시 풍속과 도교풍의 내세관을 보여주기도 했다.
◇한국 고고학을 업그레이드시켰다
박순발 충남대 고고학과 교수는 “무령왕릉은 당시 우리 학계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대규모 무덤이었지만, 고고학의 인식과 수준을 성숙시킨 계기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후 경주 등의 발굴에서는 무령왕릉의 일이 반면교사가 됐고, 고고학이란 학문은 일반인의 삶 속에도 각인이 됐다.
그 뒤 반 세기 동안 무령왕릉과 함께 한국 고고학과 보존과학도 성장했다. 무덤 속 목관이 일본에서만 나는 금송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부서졌던 왕비의 금동신발이 복원됐다. 하지만 아직도 무령왕릉의 수수께끼가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다. 누가 이 무덤을 만들었고, 무엇 때문에 백제 토기 대신 중국산 청자를 갖다 놨으며, 왜 일본산 나무로 관을 만들었고, 묘실을 막은 벽돌은 왜 새것이 아닌 재활용품을 썼던 것일까? 매년 열리는 백제문화제에 맞춰 오는 9월 14일부터 특별전 ‘무령왕릉 발굴 50년’을 여는 국립공주박물관의 한수 관장은 “무령왕릉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역사의 보물창고”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