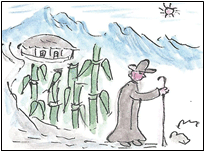
訪曺處士隱居(방조처사은거)/사암 박순
산에 있는 집에서 술에서 깨어보니
흰 구름이 한가히 달빛은 은은한데
대 숲을 빠져나오니 새소리가 들리네.
醉睡山家覺後疑 白雲平壑月沈沈
취수산가각후의 백운평학월침침
翛然獨出脩竹外 石逕笻音宿鳥知
소연독출수죽외 석경공음숙조지

아는 친지 집을 찾으면 대좌를 하고 앉으면 술이 제격이다. 은근하게 술에 취해오면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이 줄줄 나오면서 대화가 무르익는다. 주흥이 무르익다 보면 한 가락도 나왔을 법하고, 삼경을 울리기가 바쁘게 어두운 오솔길을 줄달음질 하듯이 내려온다. 조처사란 친구가 은거했던 곳은 바로 그런 곳이었음을 알게 한다. 산에 있는 집에서 먹었던 술을 깨니, 흰 구름이 한가히 떠가고 달빛은 은은하기만 하다고 읊었던 시 한 수를 번안해 본다.
돌길 울리는 지팡이 소리 자던 새만 듣는구나(訪曺處士隱居)로 제목을 붙여본 칠언절구다. 작가는 사암(思菴) 박순(朴淳:1523~1589)으로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다른 호는 은산군사(殷山郡事)등으로 썼다. 소(蘇)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박지흥, 아버지는 박우이며, 어머니는 당악 김씨로 알려진다. 1540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1553년(명종 8) 정시 문과에 장원했던 인물이다. 위 한시 원문을 의역하면 [산에 있는 집에서 먹었던 술을 깨니 / 흰 구름이 한가히 떠가고 달빛은 은은하기만 하구나 // 황급히 홀로 대숲을 빠져 나오고 보니 / 돌길 서걱서걱 울리는 지팡이 소리 자던 새만 듣는구나]라는 시심이다.
위 시제는 [조처사가 은거하는 곳을 방문하며]로 번역된다. 아는 친지를 찾아가 정담을 나누는 일은 흔히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정분을 나누면서 대좌했다. 시문을 통해 정을 나누는가 하면, 원운과 차운을 통해 시상을 겨루기도 했다. 정담이 무르익어 갈 무렵에 술 단지를 든 마님의 발길이 이어진 다음엔 주흥이 무르익어 대좌의 분위기는 절정에 도달한다.
시인은 어제도 주흥이 익어가는 대좌의 만남이 있었던 모양이다. 김 처사가 은거하는 거소를 찾아가 산에 있는 집에서 술을 깨고 보니, 흰 구름이 한가히 떠가고 달빛은 은은하다는 선경先景의 시상을 이끌어냈다. 술은 취흥을 더하지만 더 많은 시상과 더 많은 상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었을 것이다.
김처사를 만나고 난 화자는 여러 감회가 새로웠을 지도 모른다. 대좌의 만남이 다 되고난 후 화자는 황급히 홀로 대숲을 빠져 나와 자연의 시상을 그려보았더니 돌길을 울리는 지팡이 소리에 자던 새들만 들었다는 사상을 만들어 냈다. 지팡이가 돌길을 울리는 그 소리에 자던 새들도 울렸다는 시상은 비유법을 쓰는 상상이었음을 직감하게 된다.
위 감상적 평설에서 보였던 시상은, ‘먹었던 술을 깨니 달빛도 은은하네, 대숲을 빠져나오니 지팡이 소리 새들만 듣고’라는 시인의 상상력을 통해서 요약문을 유추한다.
【한자와 어구】
醉睡: 취해서 졸다. 山家: 산집. 覺後疑: 술을 깨고 보다. 白雲: 흰 구름. 平壑: 골짝을 떠가다. 골짝을 고르게 하다. 月沈沈: 달빛이 은은하다. // 然: 황급히. 獨出: 홀로 나와. 脩竹外: 마른 대나무 밖을 나오다. 石逕: 돌길. 音: 지팡이 소리. 宿鳥知: 자던 새가 안다. 잠잔 새가 듣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