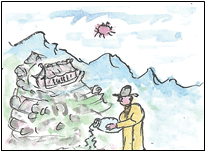
詠井中月(영정중월)/백운거사 이규보
산에 사는 중님들이 달빛을 탐하여서
병속에다 물과 함께 길어서 담았는데
달빛이 빈다는 것을 기울 때에 깨달으리.
山僧貪月光 甁汲一壺中
산승탐월광 병급일호중
到寺方應覺 甁傾月亦空
도사방응각 병경월역공

나그네의 컬컬한 목을 축여주는 곳이 두레박 샘물이다. 두레박은 아니지만 조롱박으로 떠먹는 샘물일지라도 향수가 스며있고 나그네를 덥석 안아 반기는 모습까지도 상상하게 된다. 중천에 떠있는 달이 가만히 비추는 야밤에 샘물을 내려다보면 또 다른 이색 풍경이다. 물 위에 두둥실 떠있는 달을 떠서 담은 수 있다. 절에 다다르게 되면 바야흐로 달의 이치 깨닫게 되리라 병이 기울이면 달빛 또한 텅 빈다는 그 사실이라고 읊었던 시 한 수를 번안해 본다.
병이 기울이면 달빛 또한 텅 빈다는 그 사실을(詠井中月)로 번역해 본 오언절구다. 작가는 백운거사(白雲居士) 이규보(李奎報:1168~1241)로 고려의 문신이다. 개성 출신으로 아버지 이윤수는 호부낭중을 지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민첩하여 아홉 살에 글을 잘 지었다 한다. 장성하면서 경전, 사서, 백가, 불경, 노자의 책을 한 번 보면 곧 기억하여 신동이라 불리었다. 위 한시 원문을 의역하면 [산승이 휘엉청 밝은 달빛을 탐하여 / 병 속에 물과 함께 달을 길어 담아왔었네 // 절에 다다르게 되면 바야흐로 달의 이치 깨닫게 되리라 / 병이 기울이면 달빛 또한 텅 빈다는 그 사실을]이라 번역된다.
위 시제는 [세속에 비친 달을 노래함]로 번역된다. 대시성 이규보의 시 중에서도 백미白眉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제목에서 보인 글자는 어렵지 않지만 내용은 그리 쉽게 보이지 않는 시상이다. 정확히 운을 맞추고, 달빛을 사랑하는 스님이라면 벌써 그것으로 공(空)의 생애를 충분히 실천한 분이었을 것이다. 그조차 욕심이요, 병(甁) 속의 가득찬 물을 쏟아내면 달빛 또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니, 완벽한 공(空)의 세계를 향한 치열한 싸움이 아닐 수 없다.
시인의 절묘한 표현이다. 샘물에 비친 달빛조차 색(色)의 세계로 여길 정도이니, 인식의 철저함을 넘어 시적(詩的) 형상화의 높은 수준에서는 그만 혀를 내두를 만하다. 만년에 불교에 귀의할 정도로 심취했던 시인의 생활관이 그대로 노정되어 절묘하게 정제된 작품이라 하겠다.
화자는 달빛을 병 속에 담았다는 상상적이자 문학적인 표현은 이미 수작(秀作)의 단계를 넘는다. 병을 기울면 이제는 달빛이 ‘텅 비어 없다’는 것을 절에 다다라야만 깨닫게 될 것이라는 도치법은 더욱 돋보인다. 이런 표현이 문학의 묘미이고, 문학의 경지에서만 맛볼 수 있지 않을까 본다.
위 감상적 평설에서 보였던 시상은, ‘산승이 달을 탐내 병속 담아 길러왔네, 절 다다라 깨닫으리 병 기울면 텅 빈 것을’이란 시인의 상상력을 통해서 요약문을 유추한다.
【한자와 어구】
山僧: 산 승. 산에 스님. 貪: 탐하다. 탐을 내다. 月光: 달빛. 월광. 甁: 병. 혹은 병 속에. 汲: 물을 긷다. 一壺中: 한 병의 병 속에. // 到: 도달하다. 당도하다. 寺: 절. 方應: 바야흐로. 바야흐로 응당(반드시). 覺: 깨닫다. 알게 되다. 甁傾: 병을 기울다. 月: 달. 亦: 또한. 空: 비다. 없다. 곧 달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