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의 문화예술과 향토사학의 현장에서 일 해 오며 틈틈이 수필이나 문화 관련 책자 저술에 관여해 오던 군청 문화관광과 양기수씨(57)가 이번에는 늦깎이로 시조시인이 됐다.
장흥의 문화예술과 향토사학의 현장에서 일 해 오며 틈틈이 수필이나 문화 관련 책자 저술에 관여해 오던 군청 문화관광과 양기수씨(57)가 이번에는 늦깎이로 시조시인이 됐다.
이번 <현대문예> 2008년 7-8월호(45호)의 ‘제42회 신인상’ 시조부문에 당선해 당당히 ‘시조시인’으로 입문한 것이다. 신인상 당선작은 ‘농월정(弄月亭)에서’ ‘탑’ ‘여름밤’ 등 3편.
“진정으로 그리운 임 면벽으로 자리하고/시공을 밀어붙여 솔바람 머무는데/타는 정 가누지 못해 고뇌하는 형상들//청태 낀 상념들이 바람결에 흩어지고/슬프도록 외로운 몸 침묵으로 굳었는가/감춰진 인연 자국은 돌이 되어 남았네//마음도 비워두고 인연도 떨쳐두고/세월의 뒤안길을 오가며 사는 인생/그대로 자연이고파 침묵으로 섰구나(‘탑’ 전문)”
심사의원(정소파, 오재열, 김계룡)은 심사평에서 “ ‘탑’은 연시조로서 3수가 주제를 에워싼 내적 연관이 잘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주제를 중심으로 각 수가 탑의 영원성과 불교적 시 철학이 내포되어 있어 읊을수록 그 율운이 하나의 음악으로 노래되어 있어 거듭 읽고 싶은 걸작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평하고 있다.
양기수씨는 당선 소감에서“여기저기 답사를 다니다 보면, 가슴 벅찬 아름다움을 접한다. 때론 혼자 보기가 아까운 풍광을 보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감상에 젖어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이러한 풍광과 감정을 나도 모르게 옹알이 했다 때론 삶이 팍팍할 때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께서 하셨던 콧소리의 신세타령을 언제부터인가 나도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옹알이와 콧소리 타령이 글로 표현된 것이다. 때문에 글이 세련되지 못하고 정재되지 않은 단어들의 나열로 어수룩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이런 감정들을 시어로 잘 정리해 여러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라는 뽑아주신 분들의 격려와 배려가 아닌가 싶다"고 적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참새고기도 고기다” ‘허허’ 웃으며 한 눈 팔지 않고 공무원의 길을 걸어온 인생. 양기수씨는 그동안 공직이라는 직업과 신분으로 전업 작가로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해 오지 않은 탓으로 문학과 관련지었을 때 다소 그의 이름이 생소할지 모르지만, 그는 이미 1996년 월간 ‘문학세계’ 수필 부문에서 신인상 수상으로 수필가로사 문단에 발을 내디딘 사람이다.
공직이라는 분야에서 한 눈 팔지 않고 공무원의 길을 걸어온 그의 인생. 특히 그의 하는 일이 오랫동안 주로 향토사학을 연구하고 전통 문화와 예술분야를 담당해 온 탓으로 장흥 땅 어느 곳이든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고 낡은 사당, 절의 나무 기둥 하나도 그가 만져보지 않은 것이 없다.
그는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좁은 산길, 골목골목을 발품 팔아 걸으며 보고 들은 생생한 이야기들을 노트에 적곤 했다. 가슴 짠한 엄니들 이야기, 눈 질끈 감고 싶은 못마땅한 세상 이야기, 숨어있던 장흥의 소중한 유산을 돌다 보면 눈부신 풍경에 놀라곤 했다. 혼자 보다 애 터지고 목 메이게 그리운 사람이 생각날 때면 써 내려간 시 한 수 두 수들. 이번에 당선된 시들은 시인이 일상 속에서 그렇게 느꼈던 이야기들 중 일부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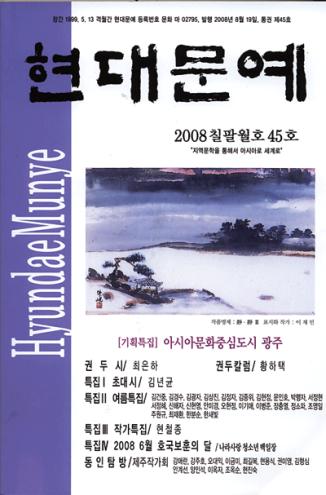
어렵고 따분한 한자(漢字)어, 난해한 말로 주저리 풀어낸 노래라는 이미지가 강해 최근 들어 시조는 독자들은 물론 작가들에게서조차 관심 받지 못한 장르이다. 하지만 양시인은 이번에 이런 시조를 친근하고 편안한 감동으로 풀어냈다.
앞으로 ‘현대시조’의 장을 넓힐 필력(筆力)을 가진 시인으로 기대를 가지게 한다.
그의 앞으로의 시조시인으로서 왕성한 활동이 기대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작품에서 시어 선택이나 메타포의 적절한 결여는 재고의 여지가 많다.
하나의 주제를 에워싼 상상의 전이는 미학적 형상화 과정에서작품이 완성하기까지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중략)”라고 지적한 평자의 말처럼, 이제 처음으로 시조시인으로서 등단했으므로, 시조작품에 대한 더 많은 노력과 공부가 많이 필요할 터이다. 양시인의 앞날을 기대한다.

